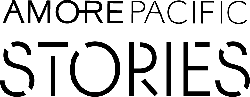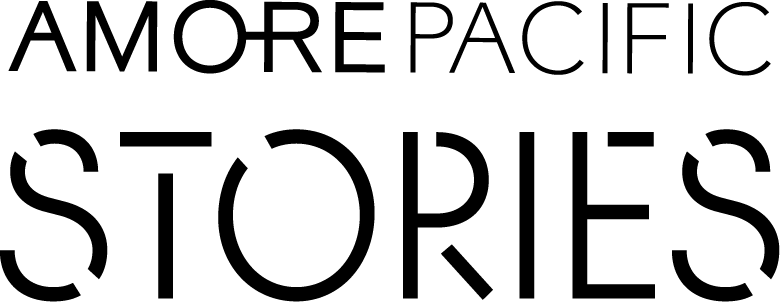

-
-
- 메일 공유
-
https://stories.amorepacific.com/%ec%95%84%eb%aa%a8%eb%a0%88%ed%8d%bc%ec%8b%9c%ed%94%bd-%ec%95%84%eb%a6%84%eb%8b%a4%ec%9a%b4-%ec%82%ac%eb%9e%8c%eb%93%a4%ec%9d%98-%eb%a9%94%ea%b0%80%ed%81%ac%eb%a3%a8%eb%af%b8%ec%85%98
아름다운 사람들의 메가크루미션

글 아무래 (가명)
#INTRO
제 하루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건 사실 보낸 메일함의 숫자나 실적이 아닙니다. 그날 유관부서와 나눈 대화의 온도입니다.
하루의 아름다움은 일의 성과보다 사람의 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드는 아름다움은 결국 이 과정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출처: 연구소 가는 셔틀버스 안 & 가끔 보는 귀여운 오리들(직접 촬영)
1 60인의 이어달리기
저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BM(Brand Manager)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관리자로서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제품 및 브랜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처음 BM팀으로 이동했을 때 동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 회사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곧 알게 될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의 제품으로 기획부터 출시까지 완주하려면 최소 6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야 하더군요.
연구소의 제형 설계와 임상부터 시작해 용기 디자인·개발, 생산·QC, 가격과 수요 전략, 콘텐츠 제작과 커뮤니케이션, 론칭과 고객 VOC 관리까지. 제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적게는 4명, 많게는 국내외 경로 담당자 20명 이상이 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담당자 찾고 이름 외우는 것부터 벅찼습니다. 지금도 ‘이건 어느 팀 담당이었더라...’ 하고 다시 연락처를 뒤적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프로젝트에 모이면, 마치 각 단과대에서 대표 한 명씩 모여 조별과제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각자의 배경이 다르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혁신을 원하고, 누군가는 안정성을 원합니다. 누군가는 정확성을, 누군가는 속도를, 누군가는 예산 효율을, 또 누군가는 ‘탁월한 아름다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BM의 역할은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시선들을 하나의 목표로 모아 단계마다 바통을 안전하게 넘기는 일입니다. 바통이 늦게 넘어오면? 앞단이 늦어진 만큼 뒤는 무조건 시간에 쫓깁니다. “고민할 틈도 안 주면서 어떻게 새로움을 만드나요”부터 “유통사에서 재촉한다니까요, 언제 정해지나요”까지. 물론 대부분 아모레퍼시픽 구성원분들은 젠틀하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드물지만요. 그래도 결국 이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는 저니까요. 앞이 늦으면 가장 심장이 떨리는 사람도, 늘 저입니다.

출처: 자체 제작(Open AI 생성)
2 지뢰밭 위의 달리기
이 릴레이는 안타깝게도 평지가 아닌 지뢰밭에서 이뤄집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너무 많아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은 늘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등장하죠. 패키지 부품이 해외 공장에서 갑자기 공급이 끊겨 발만 동동 구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협력사에서 갑자기 ‘일정 내에 못 주겠다는’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제형에서 갑자기 미생물이 발생하기도 하고, 최종 제형과 용기가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사전 점검까지 했는데 막상 완성된 제형을 펌프에 넣으면 내용물이 줄줄 흐르거나 너무 튀기도 합니다. 완주 시점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천재지변 같은 문제들이 생기면 정말 수명이 팍팍 줄어듭니다.
때로는 서로가 서로의 지뢰가 되기도 합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서에선 제품의 품질, 최종 출고까지 필요한 단계별 일정, 각 국가별로 제각기 다른 규제에 관해 아주 보수적인 의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제품 출시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준비하던 부서에서는 제형이나 디자인, 고객 커뮤니케이션 방향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순 없는 건지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도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여러 번 검토해도 오탈자는 늘 가장 마지막에 튀어나오곤 하죠. 바뀐 표시 규정을 놓치거나, 유통사가 새롭게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반영하지 못해 식은땀을 흘리며 뒷수습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정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로별로라도 출시 일정을 조정할 수 없을지 알아보며 출구를 찾습니다.

출처: 이런 저런 테스트 결과 - 절망편(직접 촬영)
3 미워도 내 편
이렇게 위태로운 달리기를 수많은 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일도 생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주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수정하시는 거예요...” 제 나름은 지뢰 하나 밟고도 간신히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건데,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담당자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야속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유관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많은 바통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요. 60명과 이어달리기를 하는 저 같은 BM 담당자가 있다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바통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지옥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끔은 저도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인데 하는 속상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번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걸 그랬나…’ 싶은 순간도 있고요. 그래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채찍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단호하게 “불가”라던 분들도, 이 모든 게 결국 고객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때 전달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 공감하고 마음을 열어주시곤 합니다. 그렇게 저 혼자선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식은땀 나는 일들이 단숨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 수 없을지 다들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주시고, 주말을 반납해가며 실험을 이어가주시기도 하고, 하루 만에 알잘딱깔센 디자인을 완성해주시고, 협력사에 연락해 일정 조율을 도와주시고, 생산 라인의 틈을 찾아, 작은 수량이라도 초도에 맞춰주시기도 하죠. 이 회사에는 그런 어벤져스 같은 분들이 숨어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사건을 해결하고 일을 되게 하는 분들 말이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바통을 잡고 신발끈을 고칩니다.
4 Finish Line: 메가크루미션

출처: YT 채널 'The CHOOM (더 춤)'
이처럼 하나의 제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함께 달리는 우리의 일은 “스우파”의 메가크루미션을 방불케 합니다. 한 명의 주인공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무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디테일이 모여 무대를 채우듯, 우리도 그렇게 각자 자리를 지키며 제품을 완성합니다. 빠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마음먹고 ‘쓱’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많이 고민할수록 고객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누군가의 밤샘, 누군가의 실험, 누군가의 ‘혹시 몰라서 다시 체크한’ 손끝까지. 모두 모여야 비로소 관객이 안심하고 박수 칠 수 있는 무대가 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함께 춤을 춥니다. 모두가 빛나진 않아도, 그 누구도 빠질 수 없는 사람들로.
-
좋아해
106 -
추천해
52 -
칭찬해
55 -
응원해
63 -
후속기사 강추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