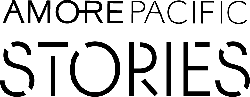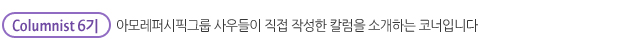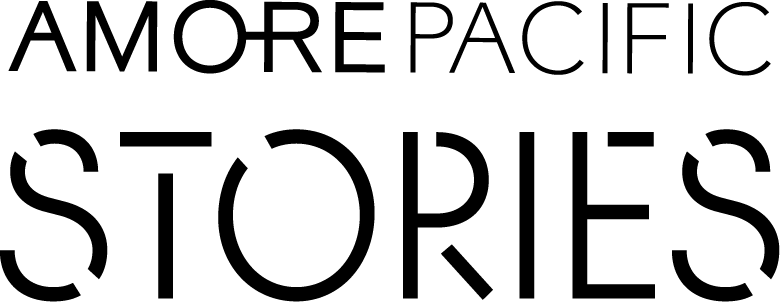

#서동현 님
2018.02.13
37 LIKE
1,729 VIEW
-
-
- 메일 공유
-
https://stories.amorepacific.com/%ec%a0%9c1%ed%99%94-%ec%84%b1%eb%b6%81%eb%8f%99-%ec%b9%bc%ea%b5%ad%ec%88%98%ec%99%80-%ea%b8%b8%ec%83%81%ec%82%ac
제1화. 성북동 칼국수와 길상사


칼럼니스트서동현 님
이니스프리 TM팀
Prologue
겨울이 움켜쥔 하늘이 차갑습니다. 잔뜩 웅크리고 발을 동동거려도 마른바람에 목덜미가 선뜩합니다. 이럴 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간절합니다. 동근 그릇 손으로 감싸고 젓가락 휘휘 감긴 흰 자락에 눈앞이 흐려질 때쯤, 오래된 탁자에 기대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관능의 대상입니다. 때로는 과학이나 선악으로까지 설명되기도 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들과 만든 사람, 먹는 사람의 모습으로 추억되는 편이 더 어울립니다.
앞으로 여섯 번에 걸쳐 오래된 식당과 그 동네의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옆구리 곁불 쬐듯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관능의 대상입니다. 때로는 과학이나 선악으로까지 설명되기도 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들과 만든 사람, 먹는 사람의 모습으로 추억되는 편이 더 어울립니다.
앞으로 여섯 번에 걸쳐 오래된 식당과 그 동네의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옆구리 곁불 쬐듯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안동에서 성북동까지
언덕배기 주름진 골목길로 접어든다. 작은 나무 간판 긴 처마 아래로 반쯤 접힌 어깨를 들이민다. 북적이는 사이를 곱이곱이 돌아 자리를 찾고, 말을 앞세워 칼국수를 부른다. 마른입 다시며 젓가락 노려보니, 허연 그릇에 정구지만 비죽비죽하다.
성북동의 오래된 칼국숫집, '국시집'의 풍경입니다. 이곳의 국수는 안동식 건진 국수를 따른다 했습니다. 건진 국수란 면과 육수를 따로 끓여 부어 먹는 국수를 말하는데, 안동에서는 콩가루와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국수 반죽에 콩가루를 섞으면 콩 비린내가 좀 나지만, 대신 면이 덜 불어서 종가 제사 손님들에게 얼른 끼니를 대접해야 할 때 요긴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진(眞)가루라 불릴 만큼 밀가루가 귀했고, 안동은 콩 농사를 널리 짓는 곳이었기에 더 그렇습니다. 어림짐작이지만, 칼국숫집 깻잎 김치는 본래 콩잎 장아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생각에 잠긴 사이,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안동 양반들이 즐기던 그 얇은 면은 아니지만, 새벽부터 손 반죽으로 치대고 정갈하게 썰어낸 300그릇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애호박을 채 썰어 국수와 함께 한소끔 더 끓여낸 후에 다진 고기를 웃기로 얹어 곁들입니다.
생각에 잠긴 사이,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안동 양반들이 즐기던 그 얇은 면은 아니지만, 새벽부터 손 반죽으로 치대고 정갈하게 썰어낸 300그릇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애호박을 채 썰어 국수와 함께 한소끔 더 끓여낸 후에 다진 고기를 웃기로 얹어 곁들입니다.
뜨거운 국물에 국숫가락 젓가락이 얼기설기 휘감긴다. 넓적 납작 가닥들이 제멋대로 어울린다. 붉어서 매콤하고, 하얗게 쫄깃거린다. 젓가락 한 바퀴 을러 타래를 풀어본다. 말캉한 호박이 자박자박 그득하다.
원래 분식집이었던 국시집이 당시 손님이었던 김현옥 서울시장의 권유로 칼국숫집이 된 것이 40여 년 전입니다. 그 뒤로 성북동, 혜화동 일대에는 이런 사골 국물 칼국숫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이 오래된 국시집과 연이 닿아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러 이제는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국시집 주방장이 세 들어 살던 집주인은 '혜화동칼국수'를 열었고, 주방 출신들은 '손국수'나 '밀양손칼국수' 등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발전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혜화동칼국수는 가는 면에 고운 양념장을 푼 뒤, 엄지손가락만 한 생선 튀김에 무생채를 곁들이는 맛이 있습니다. 손국수는 양은 냄비에서 거친 면을 펄펄 끓여 좁다란 책상에 한 팔 괴고 얼큰하게 들이켜는 풍경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심우장 근처 '성북동집'은 성긴 면 위에 호박 한두 개 슬쩍 얹고, 양념장을 툭 떨어뜨려 걸쭉하고 심심하게 먹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밀가루가 흔해진 건 일제 강점기부터이지만, 전쟁 후 미군의 구호 물품으로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게다가 국시집이 문을 연 1969년은 당시 정부에서 '분식의 날' 캠페인을 한 덕에 매주 밀가루 음식을 내야 했던 때이니, 국시집이 칼국숫집의 기원처럼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국시집의 칼국수는 사골 국물 육수를 쓰지만, 본래 안동에서는 은어(銀魚) 육수를 썼습니다. 안동댐이 만들어지기 전, 여름 낙동강을 거슬러 오는 은어를 잡아 말려뒀다가 국물을 내곤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은어는 비린내가 없고 수박 향이 난다고 해서 '수중군자(水中君子)'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기 육수를 쓰는 것은 서울식으로 변형된 부분이지만, 문어숙회나 전을 내오는 걸 보면 안동에서 하던 제사 음식 느낌이 여전합니다. 본래의 모습과 다르지만, 원형은 잃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형식을 달리해 즐길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음식이 갖추어야 할 문화적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조'라는 혈연적 개념에 매몰되지 않고, '제철', '제 곳'의 것들로 이루어진 한 그릇이라야만 완성된 하나의 끼니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북동의 칼국수는, 그런 정체성을 갖춘 몇 안 되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이러한 것이 음식이 갖추어야 할 문화적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조'라는 혈연적 개념에 매몰되지 않고, '제철', '제 곳'의 것들로 이루어진 한 그릇이라야만 완성된 하나의 끼니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북동의 칼국수는, 그런 정체성을 갖춘 몇 안 되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2. 눈이 나리면, 나를 뿌려주오
잠시 진눈깨비라도 왔는지, 국숫집 앞섶이 서늘해졌습니다. 겨울 냄새가 제법 나는 길을 지나 작은 마을버스에 오릅니다. 쟁쟁한 허기를 채웠더니 한적한 산 빛깔이 보고 싶습니다. 버스가 성북동 길상사로 향합니다.
"천 억 이래 봤자, 그 사람 시 한 줄만도 못해."
김영한(1916~1999)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7년의 혼란한 겨울, 천 억이나 되는 '대원각'의 땅과 건물을 통째로 시주한 소감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커다랗고 쓸쓸해 보이는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는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던 곳에서 범종 소리가 들리면 좋겠다던 그녀의 바람도, 스물둘에 만났다던 그 시인의 시 한 줄도, 제게는 그저 울림이 클 뿐입니다.
길상사 안으로 조금 들어섭니다. 마당 앞 관세음보살의 슬쩍 감은 눈이 낯섭니다. 가톨릭 신자인 조각가의 손에서 자비로움이 고요함으로 드러난 듯합니다. 요란하고 천박했던 술자리들의 기억을 잠재우려는 듯, 서늘하게 다문 입매에도 많은 생각이 묻어 있습니다.
길상사 안으로 조금 들어섭니다. 마당 앞 관세음보살의 슬쩍 감은 눈이 낯섭니다. 가톨릭 신자인 조각가의 손에서 자비로움이 고요함으로 드러난 듯합니다. 요란하고 천박했던 술자리들의 기억을 잠재우려는 듯, 서늘하게 다문 입매에도 많은 생각이 묻어 있습니다.
오른편의 일곱 층 돌탑은 지그시 땅을 누르고 섰습니다. 근처 교회와 성당에서 돈을 모아 세워주었다는 탑입니다. 탑돌이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없지만, 잰걸음으로 땅 디딘 자리마다 수많은 바람들이 낮게 새겨져 있습니다. 북쪽 극락당은 디귿(ㄷ) 자 모양인데, 높다란 기단 위에 남향의 창과 문들을 줄지어 달았습니다. 그런데 기단 아래에 서서 바라보니, 여덟 칸 지붕 위로 숲과 구름이 광배(光背)처럼 흐릅니다. 오랜 나뭇결 위로 햇볕이 느리게 머뭅니다. 오랜 손길들이 그 사이에서 반짝거립니다.
길상사는 겨울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스물여섯 시인이 미농지에 싸서 건넨 시에는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눈 오는 날 자신을 뿌려달라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길상사는 겨울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스물여섯 시인이 미농지에 싸서 건넨 시에는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눈 오는 날 자신을 뿌려달라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내가 /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인다(내린다) –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中
"내가 죽거든 눈 많이 오는 날, 길상사 뒤뜰에 나를 뿌려주오." - 김영한
길상사 구석엔, 작은 공덕비 하나로 남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곳엔 콩가루 밀가루 갈던 맷돌들이 그득한데, 겨울 낙엽이 부서지면 바닥이 연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엔 바람 찬 겨울날에 와야 합니다. 오래된 칼국숫집에 턱 괴고 비스듬히 앉아 백석의 시를 머금다보면, 눈 내리던 그날 밤의 나타샤가 떠오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겨울날 마른 바람에 돌꽃이 드러나면 서늘해진 침묵에 조금 맑아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상사 내리막길에서, 겨울이 천천히 늙어갑니다.
길상사 내리막길에서, 겨울이 천천히 늙어갑니다.
-
좋아해
37 -
추천해
0 -
칭찬해
0 -
응원해
0 -
후속기사 강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