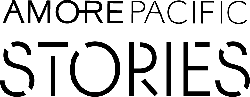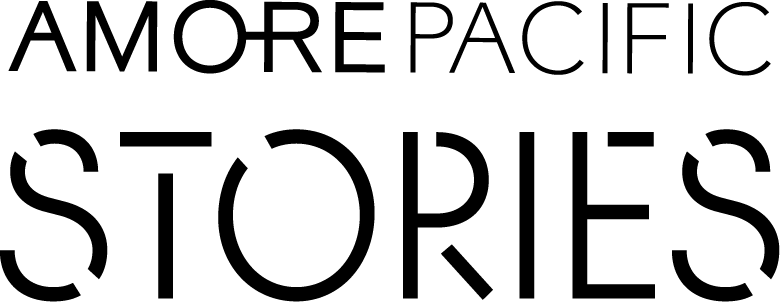

#이종욱 님
2016.02.25
25 LIKE
485 VIEW
-
-
- 메일 공유
-
https://stories.amorepacific.com/%ec%a0%9c1%ed%99%94-%ea%b3%b5%ea%b0%84%ec%9d%b4-%ea%b0%80%ec%a0%b8%ec%98%a8-%eb%b3%80%ed%99%94
제1화. 공간이 가져온 변화

Columnist
4기
4기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우들이 직접 작성한 칼럼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택에서의 삶과 노동의 진화
제1화. 공간이 가져온 변화

- 칼럼니스트
- 아모레퍼시픽 e커머스3팀 이종욱 님
# Intro
칼럼명은 다소 거창하지만, 실은 그냥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도록 아파트에서 편히 살다가 추위와 불편함으로 가득한 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살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들, 그리고 느꼈던 감정들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을 생각입니다. 뭔가 놀라운 정보와 교양을 나누는 'BBC 다큐'보다는 가끔 격하게 공감 가는 '6시 내고향'과 같은 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공간이 주는 의미
우리에게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은 1차적 기능으로 그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예로 들자면,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공간,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공간 정도로 구분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일반적 기능들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월요일 아침에는 세면대 앞에서 면도하며 사과를 먹을 수도 있고요. 동거인과의 심리적 혹은 물리적 갈등이 일어난 후에는 안방권력을 박탈 당한 자가 냉기서린 거실에서 취침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때로는 이 모든 기능적 행위가 '원룸'이라 불리는 현대적 기술과 편이로 가득한, 하나의 공간 안에 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삶과 죽음이 하나이듯,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듯 말이죠.
또한 공간은 일반적 '기능'이 아닌 소유의 형태나 지리적 위치와 상황 같은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보다 복합적인 감정으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전세인과 월세인, 자가 소유인은 집 안에서의 결단과 주체적 당당함의 차이가 참으로 극명하지요. 물론 은행의 도움 정도에 따라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띄긴 합니다만, 강북인과 강남인, 지상인과 지하인, 그리고 반지하인들이 살아내는 삶의 이해와 태도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공간은 우리에게 적잖은 영향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봐도 요즘은 먹방, 쿡방에 이어 이제 집방이 대세로 여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높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너무도 다른 개인의 취향 덕분에 먹방 같은 뜨거움은 아니지만 서도 말이죠.
집을 예로 들자면,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공간,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공간 정도로 구분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일반적 기능들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월요일 아침에는 세면대 앞에서 면도하며 사과를 먹을 수도 있고요. 동거인과의 심리적 혹은 물리적 갈등이 일어난 후에는 안방권력을 박탈 당한 자가 냉기서린 거실에서 취침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때로는 이 모든 기능적 행위가 '원룸'이라 불리는 현대적 기술과 편이로 가득한, 하나의 공간 안에 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삶과 죽음이 하나이듯,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듯 말이죠.
또한 공간은 일반적 '기능'이 아닌 소유의 형태나 지리적 위치와 상황 같은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보다 복합적인 감정으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전세인과 월세인, 자가 소유인은 집 안에서의 결단과 주체적 당당함의 차이가 참으로 극명하지요. 물론 은행의 도움 정도에 따라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띄긴 합니다만, 강북인과 강남인, 지상인과 지하인, 그리고 반지하인들이 살아내는 삶의 이해와 태도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공간은 우리에게 적잖은 영향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봐도 요즘은 먹방, 쿡방에 이어 이제 집방이 대세로 여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높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너무도 다른 개인의 취향 덕분에 먹방 같은 뜨거움은 아니지만 서도 말이죠.
#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
돌아보니 군복무 2년여를 제외하면, 삼십 년이 넘는 세월을 아파트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폐 끼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시는 엄친 덕분에 아파트적 삶에 최적화된 놀라운 능력들이 자연스레 체득 되었는데요. 기모노 여인들이나 가능할 법한 음소거 야간보행(상향식 발뒤꿈치), 볼륨 없이 TV드라마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입 모양 만으로 맥락과 스토리 이해하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 생활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같은 것들도 있지요. 주말 오후 꿀 같은 낮잠을 방해하는 너무도 큰, 그러나 때론 잘 들리지도 않는 단지 내 안내방송을 끝까지 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물론 다 듣고 나면, 그냥 아파트 마당 앞에서 동해에서 잡아온 갈치를 싸게 판다는 그런 얘기가 대부분인). 정해진 시간에 주민들이 다 함께 나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한 주 라도 거르는 날엔 보일러실이 쓰레기로 넘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아파트적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엄청납니다, 적어도 '사계절 춥지 않은 화장실'이 더 없는 축복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동생활, 집단 속에 존재한다는 정서적 안정감이 무척이나 무게 감 있게 작용을 합니다. 관리비가 아까울 때도 있지만, 방범 활동이나 제반 관리들은 적당히 품위를 유지하며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접근성 좋은 생활 동선도 한 몫 하지요. 적절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야식 업체나, 병원, 마트, 각종 카페들은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 같다'란 생각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것들이니까요
공동 생활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같은 것들도 있지요. 주말 오후 꿀 같은 낮잠을 방해하는 너무도 큰, 그러나 때론 잘 들리지도 않는 단지 내 안내방송을 끝까지 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물론 다 듣고 나면, 그냥 아파트 마당 앞에서 동해에서 잡아온 갈치를 싸게 판다는 그런 얘기가 대부분인). 정해진 시간에 주민들이 다 함께 나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한 주 라도 거르는 날엔 보일러실이 쓰레기로 넘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아파트적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엄청납니다, 적어도 '사계절 춥지 않은 화장실'이 더 없는 축복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동생활, 집단 속에 존재한다는 정서적 안정감이 무척이나 무게 감 있게 작용을 합니다. 관리비가 아까울 때도 있지만, 방범 활동이나 제반 관리들은 적당히 품위를 유지하며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접근성 좋은 생활 동선도 한 몫 하지요. 적절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야식 업체나, 병원, 마트, 각종 카페들은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 같다'란 생각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것들이니까요
# 주택적 삶, Begins..
익숙했던 삶의 균열은 문득 찾아왔습니다. 아파트적 삶의 에티켓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인간들이 생겨난 까닭이죠.^^;; 바로 저의 두 딸들인데요. 제법 절제되고 긴장된 사회적 약속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리가 없었겠죠. 10개월간 태 속에서 부유하다가, 직립을 통해 두 손의 자유를 얻고, 뜀박질이 주는 강렬한 심박동으로 실존적 경험을 만끽하는 야생적 존재들에게 그 행위를 멈추라 하는 것이 과연 순리적인 건가.. 고민이 들기 시작되었습니다.
물려줄 돈은 없지만, 적어도 자라는 동안 '집안에서 뛰지 말라'는 말만큼은 하지 말아야겠단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하여 아침저녁으로 계속되던 인터폰 속 경비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와 주변 이웃들의 격려(?)도 한몫 했었고요. 마침내 아내와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결단을 내렸고, 4년간의 전세 계약이 끝이 나던 날, 서울의 아파트를 떠나 시골(?)의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서울과 그리 먼 곳은 아닙니다만, 매우 한적한(?) 주변 상권을 고려해 편이상 시골이라 부릅니다.
밤낮으로 뜀박질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작은 TV볼륨 덕분에 주인공의 입 모양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적 삶이 드디어 시작 된 것이죠. 거의 매주 조그만 마당에선 지인들을 초대해 돼지목살 파티를 했고, 커다란 벽에 빔을 쏘며 심야영화를 즐기기도 했지요. 가족들은 모두 흥분했고, 놀람과 기쁨으로 가득한 일상은 당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넓은 공간들을 어떤 것들로 채우면 좋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말이죠.
물려줄 돈은 없지만, 적어도 자라는 동안 '집안에서 뛰지 말라'는 말만큼은 하지 말아야겠단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하여 아침저녁으로 계속되던 인터폰 속 경비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와 주변 이웃들의 격려(?)도 한몫 했었고요. 마침내 아내와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결단을 내렸고, 4년간의 전세 계약이 끝이 나던 날, 서울의 아파트를 떠나 시골(?)의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서울과 그리 먼 곳은 아닙니다만, 매우 한적한(?) 주변 상권을 고려해 편이상 시골이라 부릅니다.
밤낮으로 뜀박질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작은 TV볼륨 덕분에 주인공의 입 모양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적 삶이 드디어 시작 된 것이죠. 거의 매주 조그만 마당에선 지인들을 초대해 돼지목살 파티를 했고, 커다란 벽에 빔을 쏘며 심야영화를 즐기기도 했지요. 가족들은 모두 흥분했고, 놀람과 기쁨으로 가득한 일상은 당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넓은 공간들을 어떤 것들로 채우면 좋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말이죠.
# 1화를 마치며…
주택적 삶이 시작되고,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저 밤새 뛰어 놀아도 누구도 뭐라 않는 공간만을 생각하며 이사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몇 가지 삶의 관점들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약간의 집착까지 보이는 스스로를 보며 참으로 신기해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로서 지금의 공간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몇 가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막연하지만, 무언가 역동적 삶으로의 주체적 변화가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
좋아해
25 -
추천해
0 -
칭찬해
0 -
응원해
0 -
후속기사 강추
0